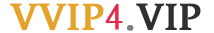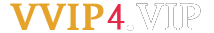“이사 가려니 보증금 2억 더 내래요”…아파트 전셋값 ‘쑥’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5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5.9억
2년 새 5000만원 이상 올라
서초구 9.8억·강남구 8.8억
서초 1억·과천 2억 넘게 상승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새 5000만원 넘게 오른 가격이다. 서울에서 평균 전셋값이 가장 높은 서초구는 1억원 이상 올라 10억원에 가까워졌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경기 과천 전셋값이 2억원 이상 올라 8억588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실거래가 기준 아파트 평균 전세 금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23년부터 2년 연속 상승했다. 2022년 5억3710만원→2023년 5억3580만원→2024년 5억7480만원→2025년 5억9040만원으로 2023년 소폭 떨어졌다가 2년에 걸쳐 5460만원 올랐다.
전세보증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서초구(9억8550만원)였다. 2023년(8억8240만원)보다 1억310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용산구는 7억520만원에서 7억8860만원으로 8340만원 올랐고, 마포구는 5억8090만원에서 6억5700만원으로 7610만원 올랐다. 강남구는 8억4330만원에서 8억8300만원으로, 송파구는 6억4030만원에서 7억380만원으로, 종로구는 6억540만원에서 7억130만원으로 올랐다.
2024년 전셋값이 치솟았다가 올해는 소폭 하락한 지역도 있었다. 양천구는 2023년 5억300만원에서 2024년 5억5560만원으로 올랐다가 올해 5억4800만원으로 조정됐다. 성북구는 4억3840만원에서 4억8450만원으로 올랐다가 4억7980만원으로 내렸다. 강동구는 4억5120만원에서 5억4100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치솟았다가 올해는 다시 4억9910만원으로 하락했다.
경기도에서는 3억4540만원은 있어야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2023년(3억1570만원)보다 2970만원 오른 금액이다. 특히 과천시 전셋값은 6억4530만원에서 8억5880만원으로 2억1350만원이나 올랐다. 성남시 분당구는 2023년 5억7210만원에서 지난해 6억140만원으로 올랐다가 올해 5억9670만원으로 내렸다.
같은 기간 인천은 2023년 2억4560만원에서 2억7080만원으로 2520만원 올랐다. 부산은 2억3470만원에서 올해 2억4700만원으로 1230만원 상승했다. 대전은 2억4580만원에서 2억4340만원으로, 경북은 1억6350만원에서 1억6090만원으로 내렸다.
6·27 대책이 불러온 전세 공급 절벽?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전셋값(9월 29일 기준)은 0.36%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1~9월 4.46%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1.87% 상승했다.
서울, 과천 등 수도권 전셋값이 부쩍 오른 것은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전세 시장 ‘공급 절벽’이 나타난 여파로 보인다.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신규 계약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감하면서 전세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7~8월 전국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 건수는 5만5368건으로, 전년 동기(7만7508건) 대비 28.6%나 감소했다.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 매입)에 활용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한 6·27 대책 여파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감소한 결과다. 올해 7~8월 전국 아파트의 전체 전세 계약 수는 8만9220건으로, 전년 동기(10만4869건) 대비 15% 감소했다. 2023년 동기(11만4361건)와 비교하면 22%나 감소한 수치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자 기존 세입자가 이주를 포기하고 현재 주거지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실제로 지난 7~8월 갱신 계약은 3만3852건으로 전년 동기(2만7361건) 대비 23.7% 급증했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도 전년 같은 기간(9539건)보다 83.2%나 늘어난 1만7477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 기간 새로 집을 구하는 신규 계약은 28.6% 급감했다. 신규 계약 감소는 서울·수도권에서 더욱 뚜렷했다. 경기도에서 신규 계약은 33.4%(2만6495건→1만7644건), 서울에서도 30.4%(1만7396건→1만2108건) 감소했다. 신규 계약을 하는 새 세입자는 기존 전셋값보다 평균 7.9%를 더 내야 했다. 지난 7~8월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이 모두 있었던 단지들 가격을 비교한 결과, 신규 계약의 전세금이 갱신 계약보다 평균 7.9% 더 비쌌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가격 차이가 1.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신규 진입자가 감당해야 할 ‘전세 진입료’가 4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2년 새 5000만원 이상 올라
서초구 9.8억·강남구 8.8억
서초 1억·과천 2억 넘게 상승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새 5000만원 넘게 오른 가격이다. 서울에서 평균 전셋값이 가장 높은 서초구는 1억원 이상 올라 10억원에 가까워졌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경기 과천 전셋값이 2억원 이상 올라 8억588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실거래가 기준 아파트 평균 전세 금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23년부터 2년 연속 상승했다. 2022년 5억3710만원→2023년 5억3580만원→2024년 5억7480만원→2025년 5억9040만원으로 2023년 소폭 떨어졌다가 2년에 걸쳐 5460만원 올랐다.
전세보증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서초구(9억8550만원)였다. 2023년(8억8240만원)보다 1억310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용산구는 7억520만원에서 7억8860만원으로 8340만원 올랐고, 마포구는 5억8090만원에서 6억5700만원으로 7610만원 올랐다. 강남구는 8억4330만원에서 8억8300만원으로, 송파구는 6억4030만원에서 7억380만원으로, 종로구는 6억540만원에서 7억130만원으로 올랐다.
2024년 전셋값이 치솟았다가 올해는 소폭 하락한 지역도 있었다. 양천구는 2023년 5억300만원에서 2024년 5억5560만원으로 올랐다가 올해 5억4800만원으로 조정됐다. 성북구는 4억3840만원에서 4억8450만원으로 올랐다가 4억7980만원으로 내렸다. 강동구는 4억5120만원에서 5억4100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치솟았다가 올해는 다시 4억9910만원으로 하락했다.
경기도에서는 3억4540만원은 있어야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2023년(3억1570만원)보다 2970만원 오른 금액이다. 특히 과천시 전셋값은 6억4530만원에서 8억5880만원으로 2억1350만원이나 올랐다. 성남시 분당구는 2023년 5억7210만원에서 지난해 6억140만원으로 올랐다가 올해 5억9670만원으로 내렸다.
같은 기간 인천은 2023년 2억4560만원에서 2억7080만원으로 2520만원 올랐다. 부산은 2억3470만원에서 올해 2억4700만원으로 1230만원 상승했다. 대전은 2억4580만원에서 2억4340만원으로, 경북은 1억6350만원에서 1억6090만원으로 내렸다.
6·27 대책이 불러온 전세 공급 절벽?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전셋값(9월 29일 기준)은 0.36%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1~9월 4.46%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1.87% 상승했다.
서울, 과천 등 수도권 전셋값이 부쩍 오른 것은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전세 시장 ‘공급 절벽’이 나타난 여파로 보인다.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신규 계약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감하면서 전세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7~8월 전국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 건수는 5만5368건으로, 전년 동기(7만7508건) 대비 28.6%나 감소했다.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 매입)에 활용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한 6·27 대책 여파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감소한 결과다. 올해 7~8월 전국 아파트의 전체 전세 계약 수는 8만9220건으로, 전년 동기(10만4869건) 대비 15% 감소했다. 2023년 동기(11만4361건)와 비교하면 22%나 감소한 수치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자 기존 세입자가 이주를 포기하고 현재 주거지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실제로 지난 7~8월 갱신 계약은 3만3852건으로 전년 동기(2만7361건) 대비 23.7% 급증했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도 전년 같은 기간(9539건)보다 83.2%나 늘어난 1만7477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 기간 새로 집을 구하는 신규 계약은 28.6% 급감했다. 신규 계약 감소는 서울·수도권에서 더욱 뚜렷했다. 경기도에서 신규 계약은 33.4%(2만6495건→1만7644건), 서울에서도 30.4%(1만7396건→1만2108건) 감소했다. 신규 계약을 하는 새 세입자는 기존 전셋값보다 평균 7.9%를 더 내야 했다. 지난 7~8월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이 모두 있었던 단지들 가격을 비교한 결과, 신규 계약의 전세금이 갱신 계약보다 평균 7.9% 더 비쌌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가격 차이가 1.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신규 진입자가 감당해야 할 ‘전세 진입료’가 4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